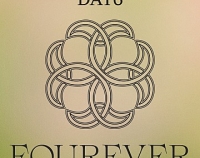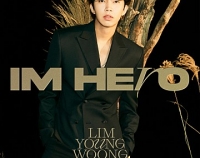깜박깜박
뜨겁게 달아오른 눈에 세게 힘을 줘서 치켜떠본다. 여린 눈동자에 누가 훅 하고 바람을 불어넣은듯 쿡쿡 쑤시는 아픔에 다시 눈을 살짝 감았다.
물기가 없이 버석하게 마른 입술을 달싹거리면 역시나 물기없이 마른 까끌한 입 속이 영 꺼림찍하다. 기분 나쁜 감각에 눈가가 슬쩍 찌푸려진다.
그런 모든 기분 나쁜 것들을 합쳐도 허리 쪽에서 강하게 느껴지는 고통에는 비할 바가 못됬다. 아..하고 나직하게 신음을 흘려보면 확 쉬어버린 목에서 쇳소리가 나서 영 듣기 싫은 목소리가 난다.
"큼..크흐음..!"
억지로 목을 쥐어짜 목을 혹사시켜 보지만 돌아오는건 여전한 쇳소리와 목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통증 뿐이었다. 제 직감으로는 분명 오랜 시간 잠을 잤다고 생각했는데 쓰러지기 전과 같이 머리는 여전히 윙윙 울리고 뜨거웠다. 쓰러지기 전과 다른 것은 몇시간 전까지 난폭하게 제 몸을 짓누르던 사내가 얌전히 제 옆에 누워있다는 것 뿐이었다.
버석하게 마른 입을 축여줄 물을 찾아 침대 밖으로 발을 슬쩍 내밀어 일어서자 마자 발끝을 타고 올라와 척추뼈까지 웅 하고 진동시키는듯한 고통에 "악!!" 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주저 앉을 뻔 하였다. 제 비명소리에 깼는지 무표정을 하고서 제 팔을 잡아 저를 지탱해주고 있는 사내의 얼굴을 한 번 빤히 쳐다봤다.
말갛고 하얀 어린티가 나는 뽀얀 피부와 약간 짙은듯한 검은 눈썹과 힘을 주어 앙다문 붉은 기가 도는 입술과 마지막으로 새카만 눈동자까지. 어제와 변함이 없었다.
저는 팔을 꽉 잡힌 채로 그는 제 팔을 꽉 잡은 채로 그렇게 서로의 눈을 마주하고만 있었다. 새카맣게 반질거리며 빛나는 눈동자가 묻는다. 왜 그랬어? 바쁘게 굴려지는 또 다른 새카만 눈동자가 대답한다. 좋아하니까.
아무런 말도 없이 눈과 눈만 뚫어져라 쳐다본지 몇 분째 태환이 제 팔을 쑨양의 팔에서 빼낸다. 눈가를 찡그리고 한 쪽 다리를 조금씩 절뚝거리며 숙소 내에 비치된 작은 냉장고를 향해 갔다. 소리를 내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이를 앙물고 허리를 애써 숙여 물병을 꺼내들어 버석한 목을 적셨다. 그제서야 답답한 기분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Park."
나직하게 제 이름이 불려진다. 잠잠하던 심장은 쿵쿵 뛰고 손에 힘이 들어간다, 끝의 끝까지 갈라지는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지 않아 콜록콜록하고 세게 기침을 하고는 작게 대답했다.
(왜?)
제가 먼저 불러놓고는 한마디 말도 않고 그냥 저를 바라본다. 온 몸이 투시당하는 기분이였다. 어찌된 연유인지 뚫어져라 쳐다보기만 한다. 왜 그랬냐며 버럭 화를 내보고도 싶었다. 어린아이마냥 아팠다고 징징대며 품에 폭 안겨보고도 싶었다. 배신당한 여자마냥 날카롭게 뺨을 후려쳐 보고도 싶었다. 금방이라도 울듯 불안한 눈빛을 하고 저를 쳐다보는 사내를 제 품 속에 꼭 안아줘 보고도 싶었다. 그리고 제 본마음은 그게 아니였노라 귓가에 다정히 속삭여 주고도 싶었다.
(난 정말 태환이 좋아.)
문학적 기교도 없고 휘황찬란한 고백도 아니였다. 솔직하게 나직하니 담백하게 제 감정을 말해주는 사내가 퍽 귀여웠다.
(난 허리 아파.)
가시돋힌 말로 툭 쏘아붙였다. 미안해하라고 내뱉은 말에 눈을 내리까는 모습이 흡사 정곡을 찔린 어린아이 같았다. 다시 말이 없어진 그를 이번엔 제가 먼저 불렀다,
(쑨양.)
(...왜.?)
(지금은 이름 불러도 되나보네.)
한번 더 툭 쏘아붙였다. 이번에는 애써 허리의 고통을 지워가며 움직여 저보다 훨씬 큰 덩치의 사내를 품 안에 안았다. 그러고는 또 한마디 쏘아붙인다.
(지금은 안아도 되나보네.)
저를 쳐내지도 못하고 안지도 못해 안절부절하는 그 모양새가 빤히 느껴졌다,
(손 대도 되,)
제 허락이 떨어지잠자 부들부들 떨리는 팔로 저를 학 끌어당긴다. 그 힘이 허리에 가하는 아픔에 아! 하고 한 번 소리치자 그새 팔에 힘을 풀어 슬쩍슬쩍 저를 안아오는 모습이 좋았다. 이렇게 제 마음을 헤아려주고 저를 생각해주는 착한 아이가 어제는 왜 그랬나. 속으로 질문을 삼켜본다,
어제의 난잡한 관계에서 느꼈던 서러움과 혹시나 저를 향한 마음이 바뀌었나 싶어 느낀 심장을 쿵쿵 때려오는 두려움이 깨끗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나 아프다니까.)
목소리에 힘을 쭉 빼 징징대는 어린아이 마냥 저를 안고있는 사내의 귓가에 속삭이면 몸을 움찔 떨어오며 솔직한 속내를 보이는 사내가 참 좋다.
(미안해...)
나직하게 같이 귓가에 속삭여 오는 목소리와 귓가를 파고드는 봄날의 따스한 봄바람마냥 보드라운 숨자락의 주인인 사내가 참 좋다.
(그래서,.,?)
제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는지 제 얼굴을 쳐다보며 눈을 둥그렇게 떵는 사내가, 눈이 마주치자 눈을 데굴데굴 굴리다가 이내 눈을 내리까는 사내가 참 좋다.
(두번 다신 안그럴께.)
몰래 장난치다 엄마가 아끼는 그릇을 깨뜨렸다 솔직히 고하는 어린아이마냥 미안함의 뜻을 내비치며 제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사내가 참 좋다.
(그래서....?)
제 물음에 침을 꿀꺽 삼킨다. 쿵쿵 뛰어대는 제 심장을 진정시키려 하는지 크게 숨을 내뱉았다 들이 마시고는 긴장한 얼굴로 굳어버린 사내가 참 좋다.
(사랑해.)
귓가에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속삭이는 그 목소리가, 그 입에서 나오는 뜨거운 숨결이, 다정하게 입술을 맞춰오는 그도, 난폭하게 입을 헤집고 괴롭혀대는 그도, 긴장한듯 저를 안아오는 그도 모두 좋다.
그의 품에서 슬쩍 빠져나와 얼굴을 마주본다, 마주앉은채로 팔을 벋어 긴장한듯 굳어있는 사내의 몸을 슥 끌어안았다.
아까의 그마냥 귓가에 속삭였다.
(나도..사랑해..)
놀란듯 눈을 크게 뜨는 사내가 참 귀여웠다. 저를 안고 침대로 깔아뭉개는 사내가 눈에 들어온다. 제 귓가로 다시 입술을 갖다대 속삭대며 물어온다,
(그럼..그 때는 왜 그랬어? 처음에 좋아한다고 했을때...)
순간 제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는 것이 적나라하게 느껴졌다. 팔을 뻗어 그의 몸을 제 위로 겹쳐놓고 볼을 잡아 얼굴을 끌어당긴다. 숨겨온 제 마음을 다 털어놓는다.
(한번에 좋다고 하면............너무 쉬워 보이잖아...연애에는 밀당이 필요하대.)
제가 생각해도 여우같은 미소를 지으며 귓가에 속삭댄 후 보드라운 귀에 촉-하고 입을 맞추고 그의 품 안으로 쏙 파고들었다. 피식하는 웃음을 짓고 다시 저를 강하게 안아오는 사내를 향해 팔을 뻗어 그를 꽉 끌어안았다.
**************************************************************************
오늘 분량 정말..ㅎㄷㄷ네요.ㅋㅋㅋ
제 오른손가락은 이미 퉁퉁 부어오르고 있답니닼ㅋㅋ오늘도 왼손 독수리 타자의 위엄을 보여드리는군요..
아 그리고 전....며칠전 10화에 수위글을 쓴 이후로 ㅠㅠㅠ전 더이상 수위를 쓰면 안되겠다는 다짐을 하였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