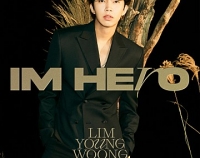미치도록 투명한 (ME TOO) 05
아, 그래.
사귀자고.
너랑, 내가.
"쌔앰."
지금 나를 뚫어져라 보는 건 모마에 그림을 전시한,
천재에다 건방지고 당돌한 마크다.
너는 이민형이니, 마크니.
나는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민형을 찾으려 한다.
내가 알던 소년을.
시간이란 참 무서운 것이어서, 내 눈은 이민형을 잡아낸다.
불안하게 까딱이는 손가락과, 시선을 피하는 눈, 그리고 자근 자근 깨무는 안쪽의 여린 볼 살도.
"민형아."
네 얼굴 위로 분홍을 끼얹는다.
네 얼굴을 보지 못하게.
"나는 내가 일과 연애 모두 집중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네 태도가 진심인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 쌤은 네가 남자로 보이지 않아.
물론 너는 착하고, 좋은 학생이지만, 너랑 사귀기에 넌-"
분홍.
네 표정이 어떤지 모르게.
나는 분홍으로 너를 죄다 뒤덮어 버린다.
말이 멈춘 사이, 색이 엷어진다.
비겁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래서 내 세상이 완전히 깨끗해질 때에야 그 말을 내뱉는다.
"너무 어려. 민형아."
"그런 말 하지마."
네 얼굴이 분홍에 씻겨간다.
분홍이 사라져 가는데, 나는 네 얼굴을 볼 용기가 안 난다.
도망치고 싶다.
여태 그랬던 것처럼.
온갖 색으로 뒤덮인 내 세계에 숨고 싶다.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심 쌤, 그럴 거면 물고기를 그려주지 말았어야죠."
"네가 먼저-"
"그렇다고 덥석 그려주는 게 어딨어.
심이는 너무 착하다.
너무 착해서 나빠."
알 수 없는 말들을 투명하게 툭툭 던지고서 너는 자리를 뜬다.
나는 어쩔 줄을 모른다.
너 같은 사람이 처음이니까.
나에게 투명한 사람이 처음이니까.
그래서 너를 좋아하다가, 내 마음이 어떤 색에도 숨지 못하고 투명해져 버릴까 봐.
나는 무섭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도, 또 다시 월요일이 찾아들어도 너는 오지 않는다.
나는 네 핸드폰 번호를 모른다.
네가 어디 사는지는 안다.
나는 네가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모른다.
나는 네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안다.
나는 네가 나를 좋아하는지 모른다.
나는 내가 너를 좋아하는지 안다.
내 속도 모르고 아이들은 제 나이답게 재잘댄다.
"심 쌔앰, 오늘은 민형이 오빠 안 와요?"
"응, 민형이 오늘 안 올 거야."
"왜요오."
"민형이 조금, 아파."
거짓말을 해 버린다.
아프겠지. 아플 테지.
집으로 가는 길이 서럽다.
너는 온갖 색에 떠다밀리는 나를 투명하게 적셔 주지 않는다.
내 눈앞은 금세 색으로 뒤덮여 어지러워진다.
귀마개 안 꼈구나.
귀마개를 급히 찾지만 핸드백을 뒤져도 눈앞은 색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지나가는 사람이 부딪쳐 욕설을 퍼붓고, 차가 빵빵 경적을 울리고, 색이 가실 만치 눈 앞은 다시 현란한 색들로 뒤덮인다.
귀마개를 끼는 것도 잊어버리다니. 김심 미쳤구나. 미쳤지, 아주.
손에 미지근한 물방울이 툭 떨어진다.
비가 내리네.
나는 입술을 꾹 깨물고 손끝에 감각을 집중하려고 한다.
머릿속을 쉼 없이 떠도는 이민형이 아니라.
나는 쪼그려 핸드백 속 어디에 놔뒀는지 기억하려고 애쓴다.
너를 만나기 전까지 내 삶은 이렇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나는 너를 그리워한다.
투명한 너를 그리워한다.
먹구름이 내 손등 위에 비를 흩뿌린다.
먹구름이 걷히고 해가 인사할 거야.
너처럼.
36.5℃의 손이 내 손을 잡는다.
"심 쌤, 정신 차려요. 제 말 들려요?"
색이 옅어진다.
네 얼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네 얼굴을 볼 수 있는 지금은 모를 수가 없다.
"김 심. 심아, 괜찮아?"
나는 그래서 너를 붙잡는다.
물 밖의 물고기처럼 헐떡이면서, 물을 찾듯이.
마치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너를 끌어안는다.
"괜찮아요, 진짜?
저 여기 있어요.
어디 안 가요."
머뭇거리던 손이 등에 오르고 너는 나를 토닥인다.
투명한 바람을 속삭이면서, 나를 어르고 달래 끝내는 울게 한다.
"쉬, 착하죠.
사람들이 심 쌤 봐요. 응?
부끄러우면 어서 뚝 그쳐요.
뚝 그치고 나면 같이 영화 보러 가요."
능청스러운 네 말에 나는 웃는다.
나를 웃게 하는 것도 너고, 울게 하는 것도 너다.
어느 쪽이든 네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다.
"나 안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지."
"그런데 왜 안 왔어요."
"너도 안 왔잖아."
"난 심 쌤 집 몰라요."
"학원 말이야."
"학원은 내가 왜 가요?
화가로 대성했으니까 내일부로 끊을 거예요.
아, 늦었는데 표가 남았으려나.
심 쌤 저번에 뭐 보고 싶다 그랬죠?"
너는 울음을 그친 내게 손을 내민다.
투명하리만치 하얗고, 따뜻하고, 굳은살이 박인 네 손은 내게 이상한 위로를 준다.
네 손을 잡고 있으면 어떤 색도 내 눈을 가리지 못할 것만 같다.
네 손은 미약하게 떨리고 있다.
나는 그게 나와 같은 종류의 떨림이길 바라면서 네 손을 잡는다.
나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서면서 네 주머니에 꽂힌 티켓 두 장을 못 본 척 해주기로 한다.
내가 보고 싶어하던 로맨틱 코미디였다.


 초록글
초록글![[NCT/이민형] 미치도록 투명한 (ME TOO) 05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7/02/09/0/7208de54be1bff1a1356c1cabff62235.gif)
![[NCT/이민형] 미치도록 투명한 (ME TOO) 05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7/03/11/0/b72fa64702e7e8736d60cfadc6467e97.jpg)
![[NCT/이민형] 미치도록 투명한 (ME TOO) 05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7/03/11/0/0a6663b3f3763b3b2233737f9722e0df.gif)
![[NCT/이민형] 미치도록 투명한 (ME TOO) 05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6/11/21/13/863a690f54175130f3c1dcfa8ee4ddc1.gif)
![[NCT/이민형] 미치도록 투명한 (ME TOO) 05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6/08/28/21/f95dd270c3e8fd63e7308ed7bc2eca25.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