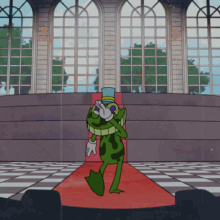![[워너원/강다니엘] 원나잇, 원타임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8/01/31/0/729c7c9c272e3aa80273e48ab91f4086.gif)
원나잇, 원타임
What Does The Fox Say 외전
누군가 나의 잘못을 얘기하라 하면 나는 그렇게 대답하겠다. 술만 마시면 치대는 나의 미친 술버릇을. 그 날의 난 밀린 시험을 끝으로 종강을 했었다. 종강만 했으면 좋을텐데 거기다가 아주 시원하게 나를 차버렸던 남자친구까지 덤으로 가져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랬나. 태어나서 한 번도 가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클럽을 갔고 죽어라 부어마셨던 덕에 이미 한껏 넘어버린 내 주량따위 신경을 쓰지도 않았던 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친구들에게 화장실을 가겠다 통보를 하고 갔었다. 혼자 말도 없이 사라지면 서로를 신랄하게 욕을 하자고 약속을 했으니, 난 내 본분을 다 한 셈이었다. 다만 친구들은 큰 음악소리에 내 말을 들었을리 만무했고 난 화장실을 가는 도중에 가까스로 부여잡은 벽에 쭈그려 앉았을 뿐 화장실은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어지러운 주변 공기와 숨을 쉴 때마다 자연스레 맡게 되는 술 냄새. 부모님이 알면 큰일 날 일이었다. 스물하고도 둘이라는 나이를 먹을 때까지 남자 한 번도 사귀어보지 못한 제 딸이 이런 곳에서 인사불성으로 취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자신의 아버지는 아마 뒷목을 잡고 쓰러질지도 모르겠다.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있어."
근데 그것도 모자라 벽에 간신히 기대어 있는 나를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에 나는 몽롱한 이 취기와 더불어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얼씨구나, 하고 안겨버린 남자의 너른 품에 안긴 걸 끝으로 더이상의 기억은 나지 않았다.
".....와, 미쳤다."
기억을 했어야 했다. 술을 마실지언정 주량을 넘기지 말았어야 했고 취할지언정 정신은 붙잡고 있어야 했다. 처음 보는 공간과 푹신하게 느껴지는 침대, 그리고 내 등 뒤로 느껴지는 단단한 남자의 팔 힘까지. 내가 겪어보는 모든 인생을 통틀어 오늘만큼 화려한 날은 없을 것이라, 단정한다. 눈을 짧게 한 번, 길게 두 번 감았을까 아무리 모른 척을 하려고 해도 내가 안겨 있는 남자의 몸은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았고 나 또한 실오라기 하나 입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꽤나 가까이에 붙어 있는 나와 남자의 거리는 고작 종이 한 장이 들어갈까, 말까한 거리였다.
"일찍 일어났네."
문득 귓가에 낮게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는 아마 다른 곳에서 들었다면 듣기 좋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어쩌다가 이런 꼴로 마주하게 되어서. 이 미친년아 술 좀 작작 쳐마시지. 혼잣말로 조용히 뇌까리다가도 고개를 들어야 했다. 마음 같아선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일어나는 대로 바로 옷을 입고 갔어야 했는데 차마 그럴 타이밍도 놓쳤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욕을 하는 와중에도 이불을 끌어당겨 가슴을 가리고 있자 그런 나를 보며 또다시 작게 웃는 소리가 연달아 터지고 있었다.
"굳이 가리지 않아도 예쁘던데."
"아침부터 개소리 한 번 잘 하시네요."
"그렇게 들렸다니 아깝네. 난 진심이야, ㅇㅇ야."
너무나 친숙하게 불러오는 내 이름에 순간 뒷골이 땡겨오는 기분이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단순한 질문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왜냐면 고개를 들어 마주한 얼굴 하나에 모든 답은 나와 있었거든. 분명 나는 술을 취하면 기억이 나지를 않았다. 완벽하게 블러 처리가 된 내 기억은 웬만하면 다시 복구될 일이 없는 이미 삭제가 되어버린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어제는 화끈하더니 오늘은 수줍어 하고, 매력이 다양하네. 우리 자기는, 라며 시덥잖은 소리를 하는 남자를 보자마자 모든 게 되풀이 되고 있었다.
'....어? 선배!'
'ㅇㅇ야, 혼자 왔어?'
'아니 친구들이랑 왔눈데에, 왜 없을까아-.'
그런 소름끼치는 애교를 부렸다. 내가, 다름 아닌 나를 차버린 전남친의 친구이자 과대인 강다니엘한테. 선배 도대체 왜 준석오빠가 저를 버린건지 물어봐 주면 안돼요? 내가 못생기고 성격이 고약해도 그렇지 막 그렇게 차면 ㅇㅇ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오. 와, 씨발. 나 거기서 울기까지 한 거야? 왜 울어, 미친년아.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 한 번 물꼬가 트기가 무섭게 계속해서 떠오르는 기억들은 도무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준석이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
'네?'
'너 예뻐.'
성격도 내 스타일인데. 다정한 목소리로 내 귓가에다가 나직히 속삭이던 선배는 여전히 잘생겼고 다정했다. 그래, 얼굴만 봐도 황홀할 지경인데 뭔들 부족해. 나를 칭찬해주는 다니엘의 목소리가 좋았고 말투도 좋았다. 점점 몸을 가눌 수 없어 다리마저 힘이 풀린 나를 한 팔에 가두는 그의 몸짓도 마음에 들었다. 더구나 무작정 들어온 호텔의 침대 시트에 내 몸뚱아리가 닿자마자 내 얼굴을 부드럽게 만져오는 손길마저 따뜻했다. 이대로 헤어지기 싫은데. 나 갈까, ㅇㅇ야? 싫어요. 그럼? 가지마, 나랑 있어. 다니엘. 술이 이래서 무서웠다. 조심하라는 말을 어긴 댓가는 톡톡히 치루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기억의 막바지에 다달아서야 셔츠를 풀어오는 그의 손짓 하나에도 들떠 열에 가득 찬 숨을 내뱉던 나를 떠올릴 수 있었으니까.
"다 기억났구나."
"......"
"괜찮아. 준석이한테는 말 안 할게."
그럼 됐지? 어젯밤에 대한 일이 모두 생생하게 기억되자 나는 이불보를 더 세게 끌어 당겼다. 빨리 옷이나 입고 나가야지. 이러다간 더이상 얼굴 볼 면목도 없을 것 같았다. 아무리 차이고 난 이후라도 전남친의 친구와 대뜸 원나잇을 했던 내가 나빴다. 한 번도 이런적은 없던지라 모든 첫경험이 남자친구도 아닌 별로 일면식도 없는 학과 선배인 게 더 문제였다. 내 부주의함을 탓하며 반쯤 몸을 일으키고 있을까 그런 나를 당겨오는 팔은 다시금 그의 얼굴과 나의 사이를 단 한 뼘의 차이로 마주하게 만들었다.
"나 너 이렇게 보내주기 싫은데."
키득거리며 내 입술에 짧게 입을 맞추던 선배는 그 뒤를 모르는 남자였다. 많은 남자를 만나보지도 못한 내가 이런 만남을 원했던 건 결코 아니었다. 다 늦은 점심에 일어나자마자 단순한 뽀뽀로 끝날 줄 알았던 입맞춤이 진득하게 떨어질 줄 몰랐던 것도, 하얀 이불 하나를 두고 두 사람의 몸이 마주닿은 게 썩 나쁘지 않은 것도, 비단 따뜻함을 넘어 뜨겁기만 한 둘 사이의 열기가 이다지도 좋을 줄 누가 알았으랴.
"우리 하루만 더 있다 갈까?"
이러면, 정말 헤어지기 싫어지잖아.
ONE NIGHT, ONE TIME
![[워너원/강다니엘] 원나잇, 원타임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8/02/06/15/2b89f6511994bc93f38209db6db97dd0.jpg)
선배미 낭낭한 늑대 다니엘 X 후배 같지 않은 후배 여주
안녕하세요, 라이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쓴 단편 분량 같지도 않은 이 짧은 글은 그냥 넘기셔도 되는 왓더즈폭스세이의 외전 같은 글이에요.
뭔가 다니엘이 연상이면 어떨까, 하는 마음과 함께 잘생쁜 늑대의 기운을 듬뿍 받은 다니엘과 어쩔 줄 몰라하는 어린양의 여주를 시놉으로 해서 생각해 본건데....뭔가 망삘이 오네오,,,,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느낌으로 던져 두고 가는 글이니까 구독료는 없습니다...부디 잘만 봐주세요...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중점은
메.리.크.리.스.마.스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초록글
초록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