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이상하게도 문에 달린 종들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것에 의아함을 느끼고있을 때, 인기척이 들려왔다.
“어서오세요.”
이 가게의 주인장 처럼 보이는 웬 멀끔한, 아니 꽤나 수려하게 생긴 남자가 인사를 건네왔다. 한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컵을 든 채.
나는 가볍게 고개짓으로 인사를 받은 뒤 가게 내부를 둘러보았다.
방에서 보았던 고풍스러운 문과 비슷한, 앤티크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인테리어였다.
테이블이며 의자며, 시계, 벽지, 하물며 잔까지 마치 중세시대에서 가져온 듯한 느낌이었다.
손님이 아무도 없는게 이상할 정도의 매력적인 분위기였다.
정신없이 둘러보다 내게 인사를 했던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러자 카운터에 걸터앉아있던 그 남자는 ‘아무데나 앉아요,’ 라고 말하며 부드럽게 웃어보였다.
창가로 보이는 바깥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이런 풍경을 살면서 몇번쯤이나 볼까, 라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만들정도로. 그래서 난 창가 바로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앉자마자 주인장은 기다렸다는 듯 다가와 내게 메뉴판을 건네왔다.
카모마일 차
페퍼민트 차
자스민 차
시트러스 차
히비스커스 차
녹차
메뉴에는 온통 차 종류 뿐이었다. 나름 커피보다는 차를 즐겨마시는 편이라, 개의치 않았지만.
조심스레 녹차를 가리키자, 주인장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곤 카운터쪽으로 돌아갔다.
가끔씩 들려오는 달그락 소리를 빼면 가게 안은 무척이나 고요했다.
그 고요함은 바깥 풍경을 즐기기엔 최상의 조건이었다. 내가 주문한 녹차가 눈 앞에 나오기 전까지 창 밖에 흠뻑 빠져있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분명 따뜻한 녹차 한잔을 시켰을터인데, 주인장이 들고 온 쟁반 위에는 쿠키가 가득 담긴 작은 그릇 그리고 녹차 두 잔이 놓여있었다.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기도 전에 주인장은 다른 찻잔을 맞은편에 내려놓고는 본인이 그 자리에 가 앉았다.
세상 어느 카페를 가도 누가 이런 일을 겪을까.
당황스러움에 녹차에는 입도 못댄채 주인장만 바라보았지만, 정작 본인은 아주 태연하고 느긋해보였다.
오히려 내게 ‘마셔요, 식겠네,’ 라며 웃어보이는 여유도 보였다.
가만히 찻잔만 바라보다 아무렴 어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그제서야 나도 나름의 여유를 갖고 따뜻한 녹차를 음미했다.
“풍경이 정말 예쁘네, 안그래요?”
주인장이 나지막히 물어왔다.
“그러게요. 노을이 이렇게 오래지는 것도 처음봐요.”
정말 이 아름다운 노을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계속됐다. 평소에는 몇십분 뒤면 사라지는게 노을이였는데.
“사람들은 노을이 찰나라서 아름다운거라는데, 난 그게 이해가 안돼. 아름다운건 계속 볼수록 좋지.”
그렇게 말하며 어깨를 으쓱인 주인장은 내게 동의를 구하듯 싱긋 웃어보였다.
그 말에 반하는 것은 아니었기에 그건 그러네요, 하고 답했다.
확실히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후로 주인장과 말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어색하거나 불편하지는 않았다. 되려 그 공간과 어우러지는 여유로움을 주는듯 했다.
달달한 쿠키를 한 입 베어 먹으니 쌉싸름한 녹차와 참으로 잘어울렸다.
혀가 아릴 정도로 달다 싶을 때, 녹차를 한 모금 마시면 입안 가득 퍼지는 향이 마음에 들었다.
이상하게 바깥 풍경은 봐도봐도 질리지가 않았다. 무엇인가에 이끌리듯 계속 쳐다보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든 생각, 이런 여유를 평소에 가질 수 있었던가.
일에 치여, 학업에 치여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들여다 보는게 그나마 삶의 돌파구인 내게 이런 기회가 많았던가.
가만히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만 보는 것에도 이렇게 크나 큰 위로를 받을 정도로 지쳐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삶에 치여살다 보면 이런 여유를 갖기가 참 힘들더라고.”
이 생각을 마치 읽은 듯 주인장이 혼잣말처럼 말을 건네왔다.
“그래도, 이런 몇 분의 여유정도는 쉽게 허락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열심히 살고있어.”
느긋하게 눈을 맞춰오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덧붙인 그 말들이 마음 속의 무언가를 일렁이게 했다.
그게 눈물이었던 것인지, 간신히 마른 눈가가 촉촉해지는게 느껴져 애써 시선을 돌렸다.
“그러니까, 자주 와도 돼.”
그 말에 고개를 다시 돌려 눈을 맞추니, 주인장은 ‘다 무료거든 우리 가게,’ 하며 부드럽게 미소지었다.
보는 사람에게 따뜻함을 안겨주는 미소였다.
녹차를 다 마셨을 쯤에 주인장은 비워진 잔과 그릇을 치워 카운터로 돌아갔고, 난 바깥의 풍경을 몇 분 더 바라보다 가게를 나섰다.
“다음에 또 와.”
기분 좋은 인사에 미소로 답하는 것도 잊지않고.


![[방탄소년단/전정국/김석진] Magic Shop_01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8/09/03/9/f2357ea00de6d300eb1cf70d8b8eb89c_mp4.g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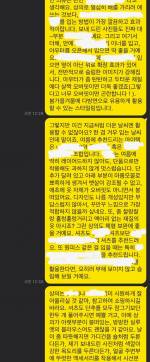

 신용카드는 하루라도 빨리 발급받아서 쓰는 게 이득임
신용카드는 하루라도 빨리 발급받아서 쓰는 게 이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