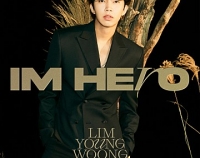![[EXO/디오] 제 오빠는 도경수입니다. (36; 글쎄말이지, 내가 꿈을 꿨는데..)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d/a/1/da1166687c68172bd3b8f5e2d8d0c3ab.jpg)
씨엔블루 - 아이의 노래
독자님들 잘 지내시고 계시죠? 오늘은 봄비도 내리고 날씨도 따뜻하고, 이제 정말 봄이 왔네요!
꽃도 피고 어느새 패딩과 코트같은 두꺼운 옷들은 입지않는, 부들부들한 봄이 1년만에 다시 찾아 왔네요.
혹시 알레르기가 있는 독자님들 계시려냐? 저도 사실 알러지가 있는데 그래도 기분은 좋아지네요.
약을 먹으며 힘내요, 우리 같이. 알러지는 왜 완치가 힘든걸까요...
주말의 반이 지났는데, 독자님들 주말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비가 내려서 밖에 돌아다니기엔 힘드실테고 음...
잘, 지내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오빠'도경수가 아닌 '동생'도경수를 데리고 왔는데, 많이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제 오빠는 도경수입니다.
(36; 글쎄말이지, 내가 꿈을 꿨는데..)
36
![[EXO/디오] 제 오빠는 도경수입니다. (36; 글쎄말이지, 내가 꿈을 꿨는데..)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f/a/e/faed05e0649430b51c151cc170474731.png)
![[EXO/디오] 제 오빠는 도경수입니다. (36; 글쎄말이지, 내가 꿈을 꿨는데..)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b/0/0/b000e9573c78ae8b72e00d23ed03b02c.png)
![[EXO/디오] 제 오빠는 도경수입니다. (36; 글쎄말이지, 내가 꿈을 꿨는데..)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c/5/7/c57a227bd62d2bd5efb2fb527da9ef11.png)
꿈 내용이 말이지...
-
어느 화창한 봄날, 집안에 나와 오빠..아니, 꿈에서는 내 동생인 경수랑 둘이 집에서 대화하는 모습에서 시작했다.
아마 외출약속을 잡은 듯한 대화가 이어졌다.
![[EXO/디오] 제 오빠는 도경수입니다. (36; 글쎄말이지, 내가 꿈을 꿨는데..)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f/b/e/fbe999635a15a97ab5c2236c195a52d5.jpg)
"누나, 누나~ 오늘 나랑 같이 놀러가는거지?"
"응, 오늘 누나가 우리경수 옷좀 사줘야겠다"
"오랜만에 누나랑 나가는거 같아, 기분좋다."
"다른 애들은 누나랑 나가는거 싫어하던데, 역시 내동생은 착해"
"빨리가자"
"조금만 기다려 화장 좀 하고"
오빠..아니, 경수는 창밖을 보며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한껏 들뜬 목소리로 나와의 외출을 재차 확인을 했고
쇼파에 앉아서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붕붕떠있는 그런 매우 밝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도 곧, 준비를 하는 나를 재촉해왔다.
![[EXO/디오] 제 오빠는 도경수입니다. (36; 글쎄말이지, 내가 꿈을 꿨는데..)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9/6/0/9606ab6c172b1a2788bee74f57e7751e.jpg)
"나가는건 좋은데..누나는 너무 오래걸려.."
"빨리 할게, 조금만..조금만 기다려"
"누구한테 이뻐보이려고 그런데?"
"우리 경수?"
"동생한테 잘 보여서 뭐해.."
"큼..그럼 누나 막 쌩얼로 간다?"
"...그러던지"
"뭐야 그 망설임은?"
"...아닌데?"
"그래?"
![[EXO/디오] 제 오빠는 도경수입니다. (36; 글쎄말이지, 내가 꿈을 꿨는데..)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8/b/d/8bd0de26d253817ee575ad7b061863b0.gif)
"으아아!!!심심해!!!!"
"아, 알았어 다했어 나간다 나가"
"빨리빨리"
"어우, 진짜...가자"
"가방 내가 들어?"
"됐네요, 얼른 신발이나 신어"
"누나"
"응?"
"힐신지마"
"네~네~"
![[EXO/디오] 제 오빠는 도경수입니다. (36; 글쎄말이지, 내가 꿈을 꿨는데..)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b/8/2b8ce0950562832085b8b174d6be2497.jpg)
"날씨 엄청좋다~"
"야, 뛰어가면 나는 어쩌라고"
"빨리 오면 되지~"
"하..천천히가"
집 밖엘 나오니 맑은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까지 완벽한 날씨에 기분이 한 없이 좋아진듯, 경수는 이리저리 방방뛰며 앞으로 나아갔고
마치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짝 뒤쳐진 나를 생각도 못한채 양팔을 벌리고는,
따스한 봄 공기를 즐기며 버스 정류장으로 밝고 힘찬 발걸음으로 향했다.
물론, 버스정류장에서도 들뜬 마음이 가시지 않아 괜히 몸을 앞뒤로 움직이기도 하고, 제 손가락으로 장난치다가도 내 왼쪽 팔을 가만 두지 못한다.
"버스왔다! 누나 이거 타야해"
"타, 버스비는 누나가 낼게"
"응응"
"학생 한명, 어른 한명이요"
띡, 감사합니다.
"누나, 여기"
내가 버스카드를 찍는 동안, 두 자리가 비워져 있는 곳에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아 두곤 나를 불러 창가에 앉힌다.
나름, 햇빛이 많이 안들어오는 자리로 잡아 불편함은 그닥 느낄 수 없었다.
기분이 매우 좋아 싱글벙글 웃으며 조잘대는 경수의 모습에 나도 괜시리 기분이 좋아져 웃으며 맞장구 쳐주는데,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기위해 출구 쪽에 온 한 남자가 나를 쳐다보다가 말을건다.
"혹시...도OO?"
"네?"
"맞구나!"
"어! 대박, 오랜만이야~"
"너도 이뻐지긴 하구나"
"오랜만에 보자마자 시비거는거냐?"
그 남자는 내가 중학교때 3년 내내 같은 반을 했던 나름 꽤나 친했던 친구였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략 6년만에 보는지라 반가운 마음에 손을 마주잡고 매우 밝게 인사를 하였고, 내리기 직전 서로의 번호를 교환했다.
그러고나서 아무생각없이 웃으며 저장한 번호를 확인하고 창밖을 보는데 문득 갑자기 조용한 경수에 쳐다보니,
![[EXO/디오] 제 오빠는 도경수입니다. (36; 글쎄말이지, 내가 꿈을 꿨는데..)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c/0/0/c00117b2299a38199f7ea9d32beb47a4.jpg)
"...."
"겨..경수야?"
뭔가 꽁하다, 분명 밝음에 밝음을 더한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던 아이인데
갑자기 뾰루퉁한 표정에 아무런 말도 하지않고 가만히 있으니 내가 순간 뭔갈 잘 못한게 있나 고민을 하는 중
"누나"
"어..어?"
"누구야?"
"누구?"
"아까 그 형"
"아, 중학교 친구"
"친구?"
"응"
"좋아했어?"
"어? 음...친구로는 좋아했지"
"그게 끝인거지?"
"그렇지."
'"난 또..."
![[EXO/디오] 제 오빠는 도경수입니다. (36; 글쎄말이지, 내가 꿈을 꿨는데..)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9/a/c/9acbaea58fde89c0eebcb7816bcd55ec.jpg)
"누나, 내리자!"
"어?..아, 응"
금새 다시 기분이 좋아져서 다행이긴 하다만.. 아직 사춘기라 그런가 감정기복이 꽤나 있네,
우리 경수 언제 사춘기가 끝나려나...?
"누나, 저기 저 가게 이쁜거 많은 거 같아"
"그럼 가자"
"누나는 뭐 안살거야?"
"원피스 하나 살까.."
"내가 봐줄게"
"그래,"
한 가게에 들어가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나는 하얀 원피스 하나를 골라 피팅룸에 들어가서 갈아입고 나왔다.
혼자서 휘적휘적 거울을 보면서 이리저리 보고 있는데,
"누나 골랐어?'
"응, 어때 경수야?"
"음..."
![[EXO/디오] 제 오빠는 도경수입니다. (36; 글쎄말이지, 내가 꿈을 꿨는데..)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e/2/a/e2a48bf7dd660886ce2a20af1471466e.jpg)
"이쁘다..우리누나,"
"진짜?"
"응, 진짜 잘어울려. 그 원피스 꼭 사"
"그래? 그럼 이거 하나 사야겠네"
"응, 꼭"
"너는? 너는 뭐 좀 골랐어?"
"이거"
"모자?"
"응"
"뭐, 이쁘네 이거만 사면 돼?"
"어...그거만 사면 될거같아"
"그래, 그럼 이 것만 계산한다?"
꿈이란 시간개념이 엄청나지 않은가? 분명 11시쯤에 나와 한 가게만 둘러보고 나왔는데 저녁 8시가 되었다.
꿈에서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엄청난 시간 격차다...
물론, 여전히 싱글벙글 신난 경수와 손을 맞잡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버스를 타고 금방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EXO/디오] 제 오빠는 도경수입니다. (36; 글쎄말이지, 내가 꿈을 꿨는데..)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e/e/5/ee51044fea16feca08d47782f34e22d5.jpg)
"누나, 잘입을게! 모자도 잘 쓰고다닐게!"
"맘에 들어?"
"응, 엄청"
"그럼, 됐어"
"다음에 또 가자"
"누나 지갑을 아주 털털 털어버리려고?"
"아니,"
"그럼?"
"그땐 내가 사줄게, 그 하얀 원피스 보다 더 이쁜걸로"
"오, 기억해두겠쓰"
"그리고"
"응?"
"남자한테 번호 막 주고 그러지마"
"번호?"
"응, 무튼 고마워 누나!"
"배 안고파?"
"음...좀 고픈거 같아"
"조금만 기다려, 손 좀 씻고 차려줄게"
"응"
"뭐 먹고싶어?"
"볶음밥!"
"그냥 볶음밥?"
"김치 볶음밥 먹고싶어"
"그래, 해줄게"
나는 냉장고에서 김치와 여러 야채들을 꺼내들어 다듬고 알맞게 썰어 밥과 함께 볶고 있는데
식탁에 앉아 "우와 맛있는 냄새'라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경수의 모습에 살풋 웃음이 났다.
금새 완성된 볶음밥을 식탁에 올리고 몇 가지의 밑반찬들을 꺼내어 먹어라고 하니, "잘먹겠습니다!"라고 외치곤
뜨겁지도 않은지 허겁지겁 볶음밥을 먹는다. 물론 중간중간 "누나 진짜 맛있다"라며 애교는 덤으로 보여주면서,
뭔가 밥을 해주기에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는 리액션들을 보이며 기분 좋게 저녁식사를 끝마쳤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어?"
"엄청"
"다행이네"
"내가 하면 왜 이런 맛이 안나지?"
"혼자 먹어서 그런게 아닐까?"
"아.. 그런가?"
"그럼 다음엔 니가 누나한테 해줘"
"그래!"
"평가를 해주지"
"헐, 긴장 되겠는데?"
밥을 다먹고 양치질을 하곤, TV를 보며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시계를 보니 11시기에 이제그만 자러 가야겠다며 내가 일어나자 자신도 자러 가겠다며 같이 일어났다.
"잘자, 경수야"
![[EXO/디오] 제 오빠는 도경수입니다. (36; 글쎄말이지, 내가 꿈을 꿨는데..)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5/7/257d239b502e7441cc61be188cee9adf.gif)
"누나도 잘자"
-
왜 잘자라는 인사에 내가 꿈에서 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선 꿈이지만 귀여운 오빠의 모습에 놀랐고,
그리고 생각보다 위화감이 없는 동생 도경수의 모습에 다음생엔 내가 누나로 태어났으면...싶가도 했고,
만약 오빠가 맏이 아닌 막내였으면 정말 애교가 꿈 속처럼 많을까 궁금하기도하고, 그렇게 다시 생각하니 우리오빠 너무 귀엽다라는 생각을 했다.
![[EXO/디오] 제 오빠는 도경수입니다. (36; 글쎄말이지, 내가 꿈을 꿨는데..)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5/c/6/5c6471bf8bc540cad311aa3f0d9b4f4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