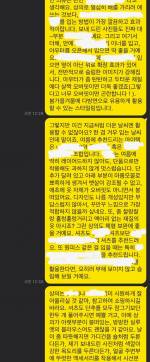[복숭아]
-9년지기 합법적 동거남을 소개합니다-
W. Bohemian Heal
***
큰 도화지에 어린 아이 실수로 먹물을 쏟아 부어버린 듯 하늘은 12시라는 고요함에 걸맞게 짙은 어둠에 물들어 가는 시간이다. 그 고요 한가운데 창을 열면 목 안까지 따갑게 시린 바람이 순식간에 들어차며 겨울이 완전하게 다가왔음 실감케했다. 모두가 잠에 들어가는 시간에 나 혼자 깨어있는 그 순간의 기분은 오묘하면서 외로웠고 동시에 안정감이 들었다. 한 마디로 모순적인 시간이지, 오늘 역시 창을 열고 양껏 찬 바람을 맞으며 이틀 전 새로 구입한 자기계발서를 손에 쥔 채 한 장씩 넘겨가고 있었다.
"야!"
고요함과 모순의 철학, 그 밤을 망치 들고 와창창 깨어주는 목소리에 복부부터 끌어올린 한숨을 크게 내뱉으며 바로 다락방 목소리의 근원에게 거침없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야한 소설책 읽냐?"
"신발롬"
이 머저리새끼의 생각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보오. 그러므로 빠이짜이찌엔, 새벽 흐름을 흐려준 권순영은 심심한 모양이였다. 수시를 마치고 수능 끝난 고삼의 밤은 평온하다 못해 꽤 자유로웠다. 그 자유를 침해 받은 나로써 다락을 향해 엿 하나 그에게 먹이고 창문을 닫자, 권순영을 날 가만둘 생각이 전혀 없는 듯 미친듯이 전화를 걸어대기 시작했다. 부재중 3통, 부재중 5통, 부재주..
"이 개시발새끼야!!!! 잠 좀 자자, 잠 좀 자자고!!!!"
가만히 있는 게 더 호구 아닐까, 부모님? 지금 부모님이 문제인 거로 보이나, 결국 책을 침대 위 던져버리고 다락 문을 덜컥 열자마자 방 안과 복도까지 울릴 목청으로 그에게 냅다 소리를 지르니 권순영은 내게 다가와 턱 입을 막았다.
![[세븐틴/권순영] 복숭아, 01: 9년지기 동거남을 소개합니다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5/11/02/20/bec989ba0bb64e74b13a4307a60a8d4f.gif)
"미쳤어?!! 이모 깬다고!!!!!!!"
"내가 깨는 거는 상관없냐?!! 매너는 바라지도 않아, 내가 밤에는 잠을 쳐 자건 책을 쳐 읽건 건들지 말라고 지금 몇번째야. 이 개자식아!!!!!!!!!!"
유일하게 마음을 놓는 시간에 8년동안 한결같은 장난에 신물이 남과 동시에 난 살짝 내 입술에 닿은 그의 손을 거침없이 앙 물었다. 그의 반응은 꼭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유추가능한, 존나게 깨방정스러웠지.
"야 이 기집애아!!! 네가 개야?!!!!!"
"엄마 아빠 깬다며 호로새끼야!!!!!!!!"
"존나 저 목청 어디서 받은 건지, 이모나 아저씨나 절대적으로 교양있으신데. 어후, 빨리 안 꺼져?"
"네가 내 목청 큰 거에 뭐 보태줬어?!! 엉?!!!!!"
핏대 세우고 지르는 소리가 복도를 통해 일층까지 내려간 건지 무슨 소리냐며 버럭 소리치며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삼일간 출장으로 오늘 오후 진이 빠져 돌아온 엄마의 걸음이 끽 끽 거리는 계단의 끝자락에서 귓가로 오소소 소름돋으며 들리우자 나와 그의 두 동공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림과 동시에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다. 손짓 발짓이 가미되어 서로를 탓하다 문꼬리가 돌리는 아슬한 소리에 권순영은 내 손목을 쥐어 벽장 그 틈으로 날 밀어넣고 뒤돌아서 태연히 엄마에게 웃어보였다. 짐 정리 하다 너무 쿵쾅거린 소리라며 둘러대는 그에 뒤에서 입을 막고 대화에 경청하던 나는 문득 보이는 어느새 고개를 한참 올려들어야 시선이 맞는 그에 키에, 그리고 턱 무심하게 벌어진 넓은 어깨에 시선이 쏠렸다. 언제 네가, 우리가 이렇게 큰 걸까.
"죄송해요, 내일 마저 할게요. 피곤하시죠? 얼른 내려가서 주무세요"
엄마는 별의심이 없이 따뜻하게 순영에게 잘자란 한 마디와 다시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자마자 순영은 저의 젖은 머리칼을 헤집으며 뒤를 돌았고 갑작스레 멍해졌던 내 바보같은 표정과 마주했다.
![[세븐틴/권순영] 복숭아, 01: 9년지기 동거남을 소개합니다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5/11/12/19/297cbae0313c66a9c10a2765e60f02c9.jpg)
"바보야, 쫄렸냐? 이모 갔잖아. 나와"
아무렇지않게 내 손목을 다시끔 잡아당겨 벽장 틈새에서 날 끌어와 세우는 그에 다시 정신을 차린 나였다. 바락바락 싸울땐 언제고 다시 저가 미안하다며 책상 위 그의 개인적인 물건을 꾹꾹 담아둔 상자 안에서 초콜릿을 한움큼 쥐어 내 손에 쥐어주는지. 아이같은 미소는 8년째 변하지 않고 그대론데, 몸만 자란 것 같았다. 얼굴에 한가득 장난끼를 품은 채 나시에 고작 회색 후드 하나 걸쳐 추운 지 부르르 떨며 침대 위로 벌렁 누워버리는 권순영을보다 그의 옆에 주저앉아 물었다.
"권순영"
"뭐"
"그만 성장해 줄래"
"뭐래, 이제 빨리 가서 자. 한 시 거의 다됐겠다"
"아 몰라"
몸을 일으켰다. 권순영만큼이나 얇은 내 옷차림에 추위가 천 틈새로 기워들어와 자리를 잡고 입술이 오들오들 떨렸다. 물기가 날아간 머리는 목덜미를 스치며 차갑게 흔들렸고 다물어진 입술 사이로 기침이 새어나왔다. ㅇ여사 또 한 소리 하시겠고만, 곧 아침에 들을 잔소리에 인상을 찡그리며 문을 열려던 순간 권순영은 내 어깨를 잡고 돌렸다.이내 내 팔을 들어 언제 벗은 건지 방금 전까지 입고 있던 후드 집업에 팔을 끼워 넣고 허리를 숙여 지퍼를 채워주는 너의 옷에서 온기가 그대로 남아 감쌌다. 그리고 그가 허리를 펴자마자 걸리는 나시 한장에 영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으로 권순영을 바라보자 너는 바로 내 마음을 알아챈듯 옷장에서 남색 가디건을 걸쳐입은 뒤 문을 열었다.
![[세븐틴/권순영] 복숭아, 01: 9년지기 동거남을 소개합니다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5/11/12/19/94587016abf69e25a70553fef3e74671.jpg)
"내가 계속 입고 있어서 완전 따뜻할 껄. 빨리 가서 자"
"너도 다락방 말고 네 방 가서 자. 여기 추워"
"몰라. 오늘 안 잘 거야"
"말 오지게 안들어. 잘자"
"너도"
***
-쾅쾅쾅!
"ㅇㅇㅇ, 학교 가자"
"나가"
-쾅쾅쾅쾅쾅!
"나간다고!"
-쾅쾅콰ㅇ콰앙쾅ㅇ쾅ㅇ!!!!
"권순영 이 미친 놈아!!!!!"
오늘 새벽의 훈훈함? 순간, 찰나일 뿐이다. 목에 건 타이, 손에 들린 교복 마이, 무거운 책가방. 몰꼴 삼합을 보며 이층이 떠나가라 처 웃는 권순영은 이미 교복을 챙겨입고 양말을 신고 있었다. 웃음이 잦아들줄 모르는 그에게 나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허벅지를 발로 힘껏 밀었다. 쿵-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진 권순영의 발목 위로 사뿐히 즈려 밟고 나가는 아침이란, 매번 반복의 반복이였지만 상황의 끝 승자는 언제나 나란 이 사실이 상쾌함을 얹어주었다.
![[세븐틴/권순영] 복숭아, 01: 9년지기 동거남을 소개합니다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5/11/12/19/cc0c6437c085cd949ec0816030e4a202.jpg)
"같이 가, 잠만보야"
어느새 몸을 일으키고 내 어깨에 길죽한 팔을 걸친 채 함께 계단에 발을 디뎠다. 아침부터 걸어온 장난에 열불을 내며 헝클어진 머리를 어깨에 올린 팔을 뻗어 정리해주며 후드주머니에서 권순영은 내게 약봉지를 꺼내 건네며 웃었다. 가끔 너는 가족보다 날 잘 알았고, 내 오빠라도 된 마냥 나를 챙기는 모습이 나를 웃게 했고 오늘도 난 웃었다. 해가 차차 밝게 차오르기 시작했다, 입김이 나오고 손이 얼음이 되어가자 너는 자연스레 내 손을 깍지 껴 잡아 주머니 안으로 넣었다. 유독 열이 많은 권순영이 필요한 순간 중 하나, 쓸모 없는 네가 필요한 순간 중 하나.
"춥다, 감기 심해지기 전에 뛰자."
9년지기 권순영은 변한게 없었다.
*********************************
처음 인사드립니다! 부족함 뿐인 글이지만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꼭 아셔야 하는 이야기! 순영이는 현재 부모님이 타국에 계시면서 가장 친한 친구분인 여주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된 겁니다. 수녕이도 부모님 계십니다!!
어색함 가득 묻은 글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은 작가에게 비타민을!


 초록글
초록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