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군의 연정 w. 채셔
10. 강보다도 넓은 그 인연을
"……살아… 계십니까."
여주는 차마 던져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질문을 윤기에게 건네보았다. 윤기는 입술을 깨물듯 꼭 닫았다. 이내 옴짝달짝하던 입술에서 목소리가 흩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전하는……….'하고 말머리를 뱉었던 윤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는 여주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여기던 찰나, 여주가 윤기의 팔을 붙들었다. 어찌 되신 겝니까, 오라버니. 서두르는 여주의 표정을 지켜보던 윤기는 혀를 끌끌 차고 말았다. …그 사내, 참으로 딱한 게지.
"폐하 드시옵니다."
"…마마께서는 고뿔이 걸리시어…!"
폐하를 막아서던 태형이 밀려나 처소 안에 내동댕이쳐지고 말았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정국이 여주의 침전에 예고 없이 들이닥친 것은. 감히 천자의 길을 막아서는 태형 탓에 덜컥 짜증이 났던 정국은 제 눈 앞에 펼쳐진 장면에 꼼짝없이 굳고 말았다. ………폐하.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뜬 여주가 이내 꼭 잡고 있던 윤기의 팔을 놓쳤다. 정국의 이가 순간 으득 갈렸다. 이것이었느냐. 분노에 떨리는 음성을 꾹 눌러 참은 정국이 낮게 효후하였다. 순간 냉기가 혜비전을 감돌았다. 윤기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다. 참으로 가련한 연정이로다. 얼음장 같던 시간을 깬 것은 다름아닌 정국의 말이었다. 이것이 네 마음이었던 게냐. 이것이…….
"………폐하."
"또한 묘안이 아니라 그저 형님의 뜻이었던 겝니까."
"…………."
"허어, 밀월 관계라도 되시는지라 그리 간언하신 게지요."
순간 긴 호흡을 내쉬던 정국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도저히 견디지 못해 달려온 혜비전이었다. 너는 어찌 이리도 잔인한 게냐. ……무연히 미소짓던 정국은 제 뒤를 지키던 남준의 칼을 빼들어 나동그라진 태형의 목을 겨누었다. 이것이 네가 말한 고뿔 증상이더냐. 서늘한 분노를 내비친 정국은 굳게 입을 다문 태형을 바라보다, 삽시에 태형을 베었다. 윽, 하고 태형이 깊게 베인 배를 움켜쥐었다. 피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경악한 얼굴로 바라보던 여주는 '안 돼!'하고 태형의 머리를 바쳤다. 죽으면 안 된다, 태형아. 태형의 머리를 끌어안은 여주의 눈에 눈물이 그득 고였다. 이번에 향한 정국의 칼날은 윤기의 목이었다. 입술을 깨물며 태형의 상처를 지혈하려던 여주를 가만히 내려다본 정국은 칼을 내팽겨쳤다.
"저 자를 당장 투옥하거라. …내 여인의 처소에 함부로 발을 들인 자다."
남준이 곧바로 윤기의 팔을 붙잡았다. 눈을 감고 미소 짓고 있던 윤기는 남준이 향하는 곳으로 순순히 발길을 돌렸다. 오라비라고 자처했던 제가 여주의 그 마음 하나 읽지 못해 섣불리 행동하였으므로. 죄인과 같이 끌려가는 윤기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여주가 작게 '오라버니….'하고 읊조렸다. 윤기가 이 야밤에 저를 찾아온 이유는 당연히… 전하의 일 때문일 터였다. 전하를 찾았거나, 전하께서 승하하셨거나. …여주의 눈에서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결국 혼절해버린 태형을 떨리는 손으로 쓰다듬은 후에 여주는 힘겹게 일어서서 정국을 바라보았다.
"………어찌 태형을 베셨습니까."
"허면 너는 어찌 우는 게냐."
"……어찌 제 사람을 베신 겝니까."
여주의 질문에 정국은 칼을 들어 여주의 목에 가져다댔다. 네 사람이라고 한 번만 더 지껄인다면, 이번엔 너를 죽일 것이다. 정국의 서슬 퍼런 분노에 여주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허나 전혀 제 목숨을 거는 것쯤, 무섭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정국이 살짝 칼을 치켜들자, 칼날이 여주의 목을 살짝 파고들었다. 살짝 찢어졌을 뿐이었으나, 생전 처음 느끼는 칼의 느낌에 절로 여주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다. 헌데 그런 고통 따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결국 침이 마르는 쪽은 정국의 쪽이었다.
"변명이라도 하거라. ……황제가 아니라 사내로서의 부탁이다."
"………."
"변명이라도 하란 말이다. 이 야밤에 형님이 혜비전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 말하는 정국의 음성에는 절절함까지 배어 있었다. 지금이라도 변명을 말하면 천치처럼 믿어줄 것인데. ……열리지 않는 여주의 입술을 안타깝게 바라보다 정국은 칼을 힘없이 내리고 말았다. 여주는 바닥에 떨어지는 칼을 바라보다 입술을 앙다물었다. 전하의 일을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저와 폐하는 이루어질 수 없나 봅니다. 여주는 꾸역꾸역 말을 삼켜내며 힘없이 웃었다. 망할 계집. 네가 무어라고. …정국이 작게 읊조렸다. 네가 무어라고 이리도 내 마음을 찢어발기는 게냐. 차마 뒷말은 꺼내지 못한 채 정국은 뒤로 돌아서 처소를 나섰다. 여주는 정국이 처소를 나서자마자 주저앉아 태형에게 기어갔다. 다리가 후들려 제대로 기어갈 수조차 없었다. 꾹꾹 눌러왔던 울음을 터뜨려낸 여주는 태형의 머리를 다시 받쳐들었다. 제 목에서 피가 줄줄 새어나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였다.
"…어의를 부르거라."
밖에서 혜비전을 지키고 있던 호석에게 정국은 지친 음성으로 일렀다. 또 저리 내버려두면 제 몸 소중한 줄 모르고 가만히 내버려둘 것이 뻔했다. 비틀거리며 처소를 나서는 정국을 서둘러 호석이 붙잡았으나, 정국은 손을 휘저었다. 호석은 다시 정국을 붙잡지 못하였다. 정작 제 몸 아낄 줄 모르는 것은 정국이었다. 몇 발짝 내딛지 못하고 정국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픽 쓰러지고 말았다.
덧붙임
반존대 초록글 넘나 감쟈합니다 흑흑 ...
메일링은 내일 밤 진행될 예정입니다!
폭구니 넘나 맴찢 TㅁT
오늘도 반가워요 이삐들!


 초록글
초록글![[방탄소년단/전정국] 폭군의 연정 10 (부제: 강보다도 넓은 그 인연을) | 인스티즈](http://file2.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16/05/07/12/038223c07237c258d1f3122a636256f0.g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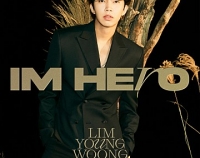


 유명 뮤직비디오 감독님 오징어게임2 후기 ㅋㅋㅋ
유명 뮤직비디오 감독님 오징어게임2 후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