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O/찬열] Honey, Cherry Baby. Prologue | 인스티즈](http://file.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8/e/28eae9b01ef9ed26616738d073460e1d.png)
본격! 내_글은_내가_표지_만든다.jpg
Honey, Cherry Baby : 세상에서 가장 예쁜 너에게.
Written by. 베브
BGM : 넌 내게 반했어 OST - 그대를 만나러 갑니다
# 프롤로그. - 먼 훗날 우리와의 숨바꼭질
쨍그랑!
“어… 어떡하지. 찬열아! 열아! 일로 와 봐!”
“잠깐만….”
내 속도 모르고 저 멀리서 자그맣게 웅얼대는 목소리에 내 다급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두둥실 떠올랐다.
어떡하지, 이 그릇. 완전히 산산조각 났는데.
혹시 찬열이 어머니께서 아끼시는 거면 어쩌지?
어쩔 줄 몰라 손톱만 잘근잘근 깨물다가 찬열이가 손톱을 깨물지 말라고 했던 것이 떠올라 손을 얼른 등 뒤로 숨겼다.
그나저나, 여기저기 널린 유리 파편들은 어떡하지.
찬열이는 아까 그렇게 크게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는데도 그것조차 듣지 못한 건지 계속 잠깐만, 잠깐만, 하며 미루었다.
나는 괜히 불퉁 튀어나오려는 못된 입술을 손으로 꾹꾹 밀어 넣고 에휴, 하는 한숨을 조그맣게 내쉰 뒤 유리 조각들이 널린 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비닐봉지에 하나 둘씩, 조심해서 큰 조각부터 차근차근 집어넣었다.
다치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다 보니 팔이 바들바들 떨릴 지경이었다.
“어, 왜.”
“됐어. 나오지 마!”
조금 삐지기도 했고, 혹시나 찬열이가 유리 조각을 잘못 밟으면 다칠까봐 일부러 오지 말라고 크게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왜 아직도 까먹고 있던 걸까. 박찬열은 하지 말라면 또 하는 청개구리란 걸. 그래서 나는,
“왜, 또. 삐졌어?”
바로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에 놀라서,
“악!!!”
“뭐, 뭐야. 유리? 야. 미쳤어?”
유리 조각에 깊게 베이고 말았다.
-
“아 아프잖아! 내가 나오지 말라고 했지!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찬열이는 내가 악을 쓰거나 말거나 내 손가락을 쪽쪽 빨고 있었다.
이게 뭔 일이야… 쪽팔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못 다 풀린 짜증을 찬열이에게 풀어놓고 싶어 안달이 난 듯 입은 계속해서 못된 말을 쏟아냈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구!”
“아, 야. 말하지 마. 흔들리잖아.”
날 집에 불러놓고 하루 종일 롤만 해대는 바람에 나는 완전히 찬밥 신세였다.
왔을 때도, 어 왔어? 한 마디만 툭 던지고. 그나마도 모니터에다 대고 한 말이었다.
그래서 나는 들어왔을 때부터 찬열이 옆에 그냥 털썩 앉아서 재미도 뭣도 없는 모니터를 함께 들여다보다가, 항간엔 졸려서 찬열이의 허벅지에 머리를 기대고 졸았다.
그러다 신경 쓰인다며 내 머릴 세게 밀어버린 찬열이 탓에 난 졸지에 막 잠에 빠졌다가 바닥을 나뒹구는 신세가 된 것이다.
침대에서 두 시간을 자고 일어났지만, 찬열이는 미동도 없이 계속 손과 눈만 움직일 뿐이었다.
찬열이에게 놀아 달라 떼를 쓰려다가, 저번처럼 크게 화를 낼까 무서워 그냥 입을 닫았다.
오늘따라 친구들은 카톡도 받지 않았고, 나는 핸드폰으로 엑소 사진을 몇 번 뒤적대다가 결국 지루함에 못 이겨 핸드폰을 침대 위로 툭 던져버렸다.
그렇게 찬밥 신세를 하니까, 내가 지금 라면이라도 끓이려고 부엌에 나온 거 아냐.
모든 원인은 박찬열에게 있는데 다치는 것도, 핀잔을 받는 것도 나란 생각이 들어 억울했다.
“야. 니가 나 들어왔을 때부터 쳐다보지도 않구, 내가 졸리다고 좀 기대도 무겁다고 밀어 버리고. 니가 나한텐 신경을 한 톨도 안 쓰니까 뭐라도 하려고 여기서 만지작대다 그릇 깬 건데. 좀 괜찮냐고 해 주면 안 돼? 애가 왜 이렇게 무심해, 진짜.”
거의 울분을 담아 다다다다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자, 눈물이 날 정도로 문득 억울해졌다.
정말, 혜미네 남친은 그렇게 잘 해준다던데. 표혜미가 막 넘어지기만 해도 괜찮냐고 나긋하게 물어봐주고.
이름이 김… 김종대였나. 그런데, 함정은 혜미가 워낙에 키가 커서 키가 둘이 비슷하단 거지만.
막 둘이서 꽁냥대면서, 혜미는 매일 플랫슈즈나 컨버스만 신고, 종대는 매일 굽 높은 운동화만 신는다더라.
혜미가 하필 과대까지 도맡는 바람에 H대 서울 캠퍼스의 거의 간판 씨씨라던데. 같은 씨씬데 얜 왜 이렇게 다르지?
한숨을 폭 내쉬었다. 손가락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프고, 앞에서 느껴지는 망설임 가득한 눈빛이 느껴져서 너무 아팠다.
괜히 찡찡댔나봐, 에이.
매일매일 단호하고 도도한 애인이 되기 위해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다짐을 해 보지만 속상하면 생각보다 먼저 튕겨져 나가는 말은 늘 날이 잔뜩 곤두선 상태였다.
“…미안해, 징어야. 화났어?”
땅굴을 잔뜩 파고들어가 지하 백만 층 정도에 육박하는 저음이 나긋하게 내 상처에 와 닿았다.
고개를 살짝 들어보자, 잘생긴 얼굴이 내 얼굴 바로 앞에서 속상한 듯 축 처져 있었다.
나는 아까도 생각했던 ‘단호하고 도도한 애인이 되자!’라는 다짐은 곧바로 잊은 채 바로 씩 웃어버렸다.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두고 어떻게 내가 아닌 척 도도해져!
사실, 이렇게 남이랑 비교하는 거 정말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사실 혜미는 애교도 많고 귀엽고 공부도 잘 하고 몸매도 좋거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찬열이는 벌써 하나 둘 셋…, 6년 동안이나 나랑 사귀고 있잖아.
중간에 여러 번 균열도 있었고 정체기도 있었지만, 아직도 설레는 걸 어떡해?
빼애- 혀를 깨물고 웃어버리자, 찬열이가 큰 손을 들어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그러게, 왜 되도 않는 삐진 척이야. 금방 풀릴 거면서. 언제까지 떠 볼 건데?”
“아니, 진짜 짜증이 나는 걸 어떡해. 손은 아프지, 너는 틱틱대지, 나는 외롭지.”
“그래, 미안. 일어나 봐. 어어… 발 조심하구.”
읏차- 손가락에 닿지 않게 조심히 내 팔을 끌어당겨 일으켜 세워준 찬열이가 조심조심 유리 파편들을 피해 거실로 나를 데려간 찬열이가 서랍에서 약 상자를 꺼내 나를 소파에 기대 앉혔다.
“앞으론 조심 좀 해.”
“알겠어… 얼른 해. 나 지금 이빨 꽉 깨물고 있어.”
소독약이 손가락 위로 끼얹어지며 상상하기도 싫은 고통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했다.
소리를 지르지 못해 앙다문 이빨 새로 좀비 같은 신음소리가 새어 나갔다.
눈을 아예 꽉 감아버리자, 찬열이가 앞에서 픽 웃어버리는 헛바람 빠지는 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왜 웃어.”
“야, 넌 나이가 몇인데… 이제 스물 셋이야, 스물 셋. 아직도 열일곱 같아.”
“어려 보인단 얘기야?”
“얼굴은 서른.”
“맞을래?”
눈을 반짝 떠서 다치지 않은 손인 오른손을 들어 등이라도 때리려 갖다 대는데, 찬열이가 능글맞게 웃으며 연고와 면봉을 꺼내 들었다.
“너 지금 나 때리면 엄청 아플걸. 네 손가락에 직격탄으로 면봉 꽂히기 싫으면 손 내려.”
쟤는 군대를 갔다 오더니 잔머리만 늘어서 왔다. 저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렇지만 정말 때렸다간 내 손가락에 면봉을 꽂고도 남을 애라서 나는 순순히 손을 내리는 편을 택했다.
조심스레 연고를 발라주고, 내가 좋아하는 도라에몽 밴드를 구김 없이 붙여준 찬열이가 손을 몇 번 뒤집어 보며 확인하고 밝게 웃었다.
“끝났다. 오늘 왼손 아예 쓰지 마. 내가 밥 해줄게.”
“오, 진짜?”
피아노를 워낙 오래 쳐서 매끈매끈하게 쭉 펴진 하얀 손을 나도 몇 번 뒤집어 보다가, 투명한 매니큐어만 발린 채 단정하게 깎인 손톱을 몇 번 긁었다.
약지에 끼워진 두꺼운 반지가 빛을 받아 쨍, 하고 빛이 났다.
유리 조각을 쓸어버릴 생각인지, 어디선가 빗자루를 찾아 들고 온 찬열이를 보고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찬열이의 손을 덥썩 잡았다.
그리고 나는 또 까먹었다, 내가 내민 손이 방금 다쳤던 손이란 걸.
“아아아아!!”
“왜, 왜 또.”
“아, 아파!!! 아 짜증나 너!!!”
나와 같은 디자인의 반지가 끼워진 찬열이의 손을 연신 찰싹찰싹 때리며 짜증을 퍼붓자, 찬열이는 영문도 모른 채 손을 얻어맞을 뿐이었다.
한참을 짜증내다가 또 베에, 웃어버린 나는 찬열이의 손을 꼭 붙잡고 내 눈 앞으로 끌어왔다.
“손도 어쩜 이렇게 예뻐.”
“오늘따라 왜 이래. 조울증 환자처럼.”
“조용히 해.”
평화로운 나날과 연보랏빛 이야기의 처음은 어딜까.
스물 세 살의 우리의 첫 만남, 열일곱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덧그려 보는 기억의 액자,
Honey, Cherry Baby. 곧 찾아올게요!
체리 베이비≠체리보이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워아이니 ♡ㅁ♡


 초록글
초록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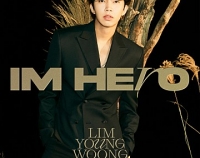




 이하늘, "지드래곤 기대 이하" 발언 결국 삭제...거센 비판에 꼬리 내려
이하늘, "지드래곤 기대 이하" 발언 결국 삭제...거센 비판에 꼬리 내려